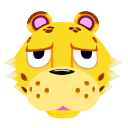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18/03/22 02:27:04 |
| Name | 기아트윈스 |
| Subject | 감동(感動) |
|
중국 전국시대의 먹물들은 인간사란게 모두 작용-반작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란 생각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자극(감:感)을 주었을 때 b라는 반응(동:動)을 산출해내는 함수 같은 게 아닐까하는 거지요. 이 경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두 가지로 압축돼요. 하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감'을 알아서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에도 적절히 '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시키거나. 대략 4세기 경부터 11세기 까지 중국대륙의 지성계를 리드했던 건 누가뭐래도 불교인데, 11세기 즈음 되었을 때 먹물 먹은 엘리트 몇몇이 불교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게 돼요. 그들이 보기에 불교러들은 위험한 '감'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불교러들은 종종 마음수양을 위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접고 절에 들어가서 조용히 참선할 것을 권하는데, 말하자면 '감'을 피하자는 거지요. 조용함. 정적. 침묵. 부동(不動). 지금도 불교러들의 강설을 잘 들어보면 묵(默), 정(靜), 적(寂) 같은 글자들이 자주 보일 거예요. 적멸보궁(寂滅寶宮)이니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니 등등. 이 엘리트들이 훗날 모든 유교탈레반의 이념적 지주가 되는 초기성리학자들인데...ㅎㅎ 여튼 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부동심을 얻기 위해 접촉을 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진짜 부동심은 많은 접촉을 통해 단련된 마음이지 접촉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태초의 깨끗함 뭐 그런 게 아니다. 눈막고 귀막고 조용히 앉아있기만하면 그게 죽은 나무 불꺼진 재(고목사회:枯木死灰)랑 뭐가 다르냐. 성리학자들 생각에 '훌륭함(德)'이란 온갓 감촉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해내는 강인한 마음가짐 같은 거였어요. 불쌍한 걸 보면 측은지심이 들고 나쁜 걸 보면 화가나고 그래야 정상이지 '모두 무상하다. 불쌍한 놈이나 나쁜 놈이나 50년만 지나면 다 백골인 것을' 이러면 열라 답답하다는 거지요. 이들이 하고자했던 기획은 말하자면 사회에 적극성과 활기를 불어 넣고, 일상생활에 의미(meaning)를 부여하려는 거였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무의미하지 않다. 매 순간 덮쳐오는 '감'에 대해 가장 올바른 '동'을 해내자. 올바른 감/동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성인도 군자도 사회 속에서 나오지 산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낙원을 건설하자. 잘살아보자. 뭐 이런 정신에 가까워요. 와 그럼 성리학이 더 좋은거네요? 음... 헤헤... 그럴까요.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괄호 안이 비어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적절함'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되고 정의되는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전대는 후대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되지요. 수 많은 성리학자들을 지금 다시 되살려놓으면 온세상에 가득한 '부적절함'을 보고 울다가 눈알이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반면에 평범한 한국인 A가 타임머신타고 조선으로 가서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터져서 사망할지도 모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촉과 대응이라는 구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나와 세계라는 양 손으로 치는 박수에 가까워요.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화가 났으면 (動) 그건 그 사건(感)과 '나'라는 함수의 합작품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부분을 생략해요. 그냥 나는 뭐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나'라는 함수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선 반성해보지 않지요. '박대통령님께서 못볼 꼴을 당하시는 걸 보면 누구나 마땅히 화가 나야 정상 아냐!?'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거나 반격을 당하거나 해서 상처를 좀 입으면 그제서야 '혹시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고 회광반조(迴光返照)도 해보게 되지요. 저는 코코(Coco)를 보고 진짜 꺼윽꺼윽 울었는데, 이건 기아트윈스라는 감&동 함수 안에 가족이라든가, 부녀관계라든가하는 코드에 과잉반응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주먹왕 랄프를 보고도 꺼윽꺼윽 울었던 걸 보면 거의 확실함미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미리 준비되어있는 상황에서 코코/랄프라는 불꽃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뽱 폭발해서 대성통곡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저는 코코를 픽사체고의 작품이라고 물고빨지만, 저와는 다른 감&동 함수를 가진 분들은 내용상 똑같은 감촉(感)에도 다른 종류의 반응(動)을 겪었을 테고, 그러므로 그런 분이 저의 평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반성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반성능력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라고 아빠가 알려줬어요). 왜 저 사람은 특정 개그코드에 쉽게 빵터지는가, 왜 그 사람은 페미니즘의 '페...'만 나와도 화를 내는가, 왜 이 사람은 다른 화제에 대해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노무현의 '노..'만 나와도 감정의 흥분을 주체 못하는가 등등. 그 마음 속을 관찰해보면 각각 특수한 코드가 숨겨져있고, 그 코드는 그 사람의 삶의 내력, 특히 젊었을 적 삶의 경험들과 끈적하게 엮여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20살일 적에 세상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라구. 다시 말하자면, 박수는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요. 주어진 [감(感)]이 무엇이 됐든, 그 감에 대응하여 찰지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손은 순전히 나의 거예요. 자주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만큼 자주 내 손을 살펴보라는 성리학자들의 지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같이 개콘이나 웃찾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코너를 보면서 크게 웃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웃기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않이 개콘 보면서 반성은 무슨.... 당시엔 열라 짱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은혜를 입은 듯. 그래서 저도 효도하는 의미로 '코코' 한 번 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울었나 안울었나 나중에 물어보고 울었다 그러면 놀려야징 ㅎㅎㅎㅎ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4-01 00:39)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3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기아트윈스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