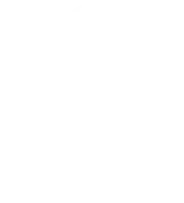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8/06/16 16:01:55 |
| Name | 나방맨 |
| File #1 | CE68F020_0501_4F52_9826_910C9275E079.jpeg (655.0 KB), Download : 19 |
| File #2 | 4DECEF74_FE4C_450F_8E9E_EEAD580740EF.jpeg (891.4 KB), Download : 16 |
| Subject | 여름 낮에 밤 눈 이야기 하기 |
|
밤 눈 네 속을 열면 몇 번이나 얼었다 녹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다른 몸짓으로 자리를 바꾸던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이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아아,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 찬 세상, 그 끝에 첫발을 디디고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너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 또 겨울이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에는 퇴근길에 커피도 마셨으며 눈이 오는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밤눈」은 그 즈음 씌여졌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삶과 존재에 지칠 때 그 지친 것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비유는 자연(自然)이라고. 그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쓸쓸한 밤눈들이 언젠가는 지상에 내려앉을 것임을 안다. 바람이 그치고 쩡쩡 얼었던 사나운 밤이 물러가면 눈은 또 다른 세상 위에 눈물이 되어 스밀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어떠한 죽음도 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밤눈」을 쓰고 나서 나는 한동안 무책임한 자연의 비유를 경계하느라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다.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그러한 믿음이 언젠가 나를 부를 것이다.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눈이 쏟아질 듯하다. https://youtu.be/1ODes7nlPrc 기형도 전집 중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