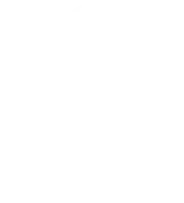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6/22 22:54:03 |
| Name | 사슴도치 |
| File #1 | 1000023586.jpg (192.5 KB), Download : 35 |
| Subject | 나는 동네고양이다. |
|
언제부턴가 이 동네에 눌러 살고 있다. 낮엔 벤치 밑이나 돌계단 위에서 몸을 말리고, 밤엔 식당 앞 온기 남은 바닥에서 웅크린다. 정해진 집은 없지만, 내가 머무는 곳이 곧 내 집이다. 여기저기 다녀보니 이 동네가 꽤 살 만하더라. 이 동네에서의 하루는 대개 햇볕으로 시작된다. 아침이면 편의점 앞 자판기 옆으로 가본다. 거기 바닥은 따뜻하고, 간밤에 누군가 떨군 과자 부스러기 냄새가 날 때도 있다.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나를 힐끔 보고 간다. 어떤 사람은 "어유, 너 여기 또 있네" 하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자주 마주치는 얼굴이다. 아마 이 구역 순찰자 같은 사람일 거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군가 나타난다. 반짝이는 네모난 걸 들고 있는 사람. 그걸 나한테 들이밀고, 웃는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조금 바보 같기도 한 표정. 해치지 않을 얼굴이다. 가끔은 자세를 바꿔준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거나, 고개를 살짝 돌려서 햇빛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오~ 예쁘다~” 하고 말한다. 뭔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 뭐, 싫지 않다. 그냥 누워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감탄해주면 나도 그 순간은 좀 으쓱해진다. 점심쯤엔 골목 쪽으로 간다. 까치들이 자주 노는 곳이다. 지붕 위 전선에 줄지어 앉아서 깍깍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멍해진다. 나는 그 아래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날아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날아가는 걸 본다. 쟤네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인다. 나는 목적 같은 건 없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운 걸지도 모른다. 어느 오후엔,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멈췄다. 천천히 봉지를 뒤적이더니 츄르를 꺼내 든다. 그건 내가 아는 냄새다. 가까이 다가가 살짝 핥는다. 아주 잠깐, 아주 가까이. 그 순간만은 허락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손을 내밀면 나는 물러선다. 츄르는 츄르고, 거리는 거리다. 그리고 해가 기울면 나는 놀이터로 간다. 아이들은 사라지고, 미끄럼틀 밑이 조용해진다. 그 밑에 누워 있으면, 낮에 데워진 금속이 등짝에 따뜻하다. 그 따뜻함은 말이 없다. 그냥 그대로, 나를 품어준다. 고양이라는 존재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온기를 믿는다. 밤이 되면 다시 골목 어귀, 식당 배기구 밑으로 돌아간다. 그 아래는 늘 훈훈한 바람이 나온다.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는다. 그날 본 까치, 츄르 냄새, 이상한 네모 물건, 사람들 웃는 얼굴. 그 모든 게 흩어지듯 스며들고, 나는 잔다. 나는 이름이 없다. 누가 부르든, 누가 쓰다듬으려 하든, 나는 그냥 나다. 이 동네에 눌러 사는, 고양이 하나.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는 떠나지 않고—따뜻한 곳을 찾아, 오늘도 산다. 6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슴도치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