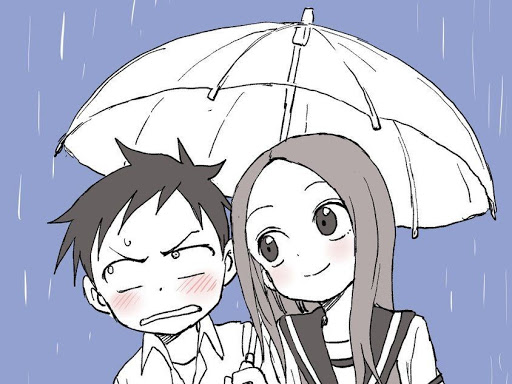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21/02/21 16:20:58 |
| Name | 소요 |
| Subject | 섹슈얼리티 시리즈 (10) - 성노동에는 기쁨이 없는가? |
|
Smith, E. M. (2017). ‘It gets very intimate for me’: Discursive boundaries of pleasure and performance in sex work. Sexualities, 20(3), 344–363. https://doi.org/10.1177/1363460716665781 - 오랜만에 왔습네다. 경합했던 논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섹슈얼리티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 미군정시기 한국 정부는 일제 공창제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비동의촬영물 유포자들은 성별과 성적정향에 따라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게이들 사이 친밀성의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가지 고려해본 결과 (너무 노골적이라거나, 맥락을 다 담아내려면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거나,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힘들다거나...) 이걸로 택했어요. - 제목부터 논란이 많을 주제이지만 함부로 소비되지 않게 잘 정리해보겠습니당 들어가며 성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성노동 연구에서 정말정말 중요한 주제에요. 많은 연구들은 성노동자들이 사회, 정치, 문화 등 수많은 맥락에 따라 조형되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표상과 이해를 따라 어떻게 정체성을 빚어내는가(craft)를 조명했어요. 과거에 올렸던 '성매매 청소녀의 사회화'에서 언뜻 언급했던 성애화(sexualization)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읽어낼 수 있죠. 하지만 저자들은 성노동자들이 일에서 경험하는 성적인 즐거움이나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는 이전까지 조명받지 못했다 해요.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9명과 인터뷰를 해서 성구매자들과의 노동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의미에 대해 탐색했어요. 성적인 즐거움과 그 의미는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권력/공연이라는 관념의 교차에서 형성된다는 게 저자들의 주요 아이디어여요. 성노동 성노동은 많은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있고, 미디어와 대중 문화에서 고정관념화 되어 있고, 페미니즘 내에서도 뜨거운 토론 대상이여요. 페미니즘 내부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성노동이 역량부여(empowerment)인가, 착취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사회적인 고정관념도 이를 닮아있는데, 한 축에서는 성 노동을 즐긴다고 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포주에게 당해서건, 마약에 중독되어서건, 인신매매를 통해서건 강제로 성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지요. 관련된 학문적 논의도 다양하지만, 먼저 페미니즘에 집중해볼게요. 페미니즘 - 성 전쟁(sex wars)과 제 3의 시각 성 전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이에요. 한 쪽에서는 성노동을 가부장제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긍정했어요. 여성성이 상연되는 방식, 이성애규범성, 단혼제에 도전하고 교란한다는 관점에서요. 이 논의에서는 성노동은 남성에게 성적으로/경제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다른 한 쪽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독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들이 성노동이 가부장제를 전복하기 보다는 강화하며, 의도치는 않아도 억압과 성적대상화에 공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제 3의 시각도 소개해야죠? 이건 둘 다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성노동은 역량강화이기도 하고 착취적이기도 하다는 접근이지요. 이성애규범성이 강화되기도 유지되기도 하고요. 아리송한데, 또 이 입장의 연구자들은 그 양가성을 가지고 성노동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앞선 두 관점은 둘 다 성노동을 단순화해서 바라봤다는 거지요. 단순성을 넘어서 양가성을 포용한만큼, 성노동에 깔려있는 복잡성도 잡아내고자 해요. 인종, 젠더, 나이, 사회구조, 종류, 성노동이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까지 포함해서 보자는 거지요. 좀 이론적인 차원으로 설명하자면 성노동에 대한 거대서사를 거부해요. 어떻게 성노동이 권력/지식의 작동을 통해 구성되는가,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개인적/집합적인 차원에서 권력과 지식을 전복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지요. 대량생산되는/공장화된 친밀성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찍기나 차별이 성노동자들에게 유해하며, 성산업이 양지로 올라온 이후에도 낙인찍기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해요. 낙인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성 노동과 개인적 삶 사이에 경계를 생성하고 유지하지요. 최근의 연구들을 리뷰한 Comte(2014)는 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는 자신들의 노동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회피한 채 노동이 지닌 상담/치료적 측면을 주장한다고 정리해요. 이러한 성노동자들의 자기이해는 '진짜 창녀'로 비추어지거나 스스로 그리 인식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게 한 이유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남편에게 충실하다는 감정을 유지하기 때문이라 하고요. 감정관리가 주제가 되면 호스차일드의 감정노동(1983)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요. 상기했던 '거리두기'에서 우리는 고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감정노동을 읽을 수 있어요. 친밀성과, 공장생산된 친밀성 사이에서 균형을 섬세하게 잡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많은 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는 친밀성을 흉내내고, 진정한 기쁨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지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일터에서는 콘돔을 쓰고, 연인과 섹스할 때는 콘돔을 안 쓰는 사례가 있었어요. 섹스 이야기를 해왔지만, 친밀성의 판매는 섹스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나요. '여친 대행', '렌탈 여친' 등으로 대표되지요. 고객에게 개인적 친밀성을 공연하는 노동이에요. 키스든, 포옹이든, 삶이나 감정에 대한 걱정이든요. 그 외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고 남성 성 노동자 살짝, 그리고 주요 이론적 관점인 푸코까지만 언급할게요. 남성 성노동자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분법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남성 성노동자 그리고 남성 성구매자에 대한 논의는 다양했어요. 물론 남성 성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남성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남성 성노동자는 호모섹슈얼 그리고 '남성적' 직업에서 일탈했다는 이중의 낙인을 지니게 된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다양성을 드러내요. 이는 남성 성노동자 -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에 그랬지요.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항존하는 혹은 압도적으로 바라보는 관념은 종교적 그리고 생물학적 담론에 뿌리를 둬요. 여성은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담론화 되지요. 이런 사정 때문에 여성 성노동자이든, 여성 성구매자이든 그 경험을 탐색하기란 힘들어요. 제가 올렸던 많은 섹슈얼리티 논문들이 남성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도 같은 맥락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노동 맥락에서 여성의 즐거움을 논하는 접근 자체가 성노동을 둘러싼 낙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여성 성노동 경험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에게 낙인의 연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극적인 연구가 지속된 것이기도 해요. 아마 섹슈얼리티 주제로 관련 연구를 리뷰하는 저한테도 미묘한 낙인이 부여되기는 할 걸요? 푸코 한 스푼 저자들은 푸코가 주창한 권력/지식의 연결체(nexus), 그리고 자기배려의 윤리를 연구 주제가 되는 경험(성노동 가운에 여성의 쾌락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렌즈로 삼아요.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 푸코는 권력은 일방향적이지 않고, 복잡한 그물망으로 작동한다 했어요. - 자기배려의 윤리는 주관성을 지배적 담론 뿐만 아니라, 예속된 혹은/그리고 지역적 지식을 포함한 '가능성의 영역field of possibilities'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봐요. -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진리'를 한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기배려는 윤리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는 담론이 억압이기보다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접근이지요. 방법론과 참여여성의 배경에 대한 소개는 저작권을 위해 생략합니다. 본문 중 일부 성적 즐거움 케이트는 연구에 참여했을 때 개인 노동자로 3개월 정도 일하던 중이었어요. 성 노동에 참여하기 전에 남성 파트너와의 섹스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했었죠. 과거 성 경험은 '끔찍'했고 '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하게' 만들어야 했었어요. 성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예측을 했었어요. 섹스에서 끔찍한 경험만 하리라고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빨리 해, 만약 니가 10초 안에 끝내지 않으면 나는 널 칠거야. 오 신이시여. 제발 좀 끝내! hurry up, if you are not off me in ten seconds I’m going to hit you, oh my god, get off me'. 이런 예측 속에서, 성 노동은 빚을 갚고 미래에 낳을 아이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견뎌야 할 것이었지요. 성 노동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녀 나름의 정당화에 영향을 미쳤죠. '한 대 맞으면 깽값으로 가족을 이룰 돈이나 벌지 If I have to get beaten up now and then that is the price I have to pay (to start a family)'. 하지만 성 노동을 시작한 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고객과의 경험이 인상적이에요. "그 남자는 딱 붙은 사각 팬티만 입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개쩔더라고요! 와 진짜 쩔었어요! (웃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죠. '왜 나를 불렀지?! 행복하게 와서 밤에 같이 놀 여자친구가 100명은 있을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장난인가?' 싶었죠. 알고보니 걔는 PT 강사였었고, 주말에는 처녀 파티에서 스트립쇼 일을 했었어요. 지난 10년 중 최고의 섹스를 즐겼던 것 같아요(웃음). 돈을 안 받아도 될 정도였죠. This guy answers the door wearing nothing but a pair of skin-tight boxer shorts he is soo hot! He is sooo hot! (laughing) Like I just couldn’t, my jaw dropped, and I just thought, ‘what are you doing calling me?! Like you must have a hundred girlfriends that would be very happy to come and hang out with you for the night’. And it, I just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s this a joke?’ It turns out he was a personal trainer and he actually does stripping work for hen nights on the weekend. And I had the best sex I think I’ve had in ten years (chuckles). And I almost couldn’t take the money. (Kate)" 그 이후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고객과 섹스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서술하기 시작했어요. '신체적으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는데요... 되게 스윗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not physically attractive to me at all but... so sweet and so lovely'. 처음의 걱정과는 별개로 그 관계는 '멋진 우정fabulous friendship'이었고, 그 남자가 오지 않을 때는 때때로 그리워하기도 했지요. 연구자는 개인적 영역에서 경험한 섹스와, 일터에서 경험한 섹스의 차이를 물었어요. 케이트가 답하기로는: " (일터에서의 섹스는) 개인적 관계에서 경험한 섹스와는 매우 달랐어요. 일할 때는 일터에 갈 뿐이고, 뭐가 나한테 좋은지, 뭐가 먹히는지, 일을 하는게 나한테 로맨틱하게 느끼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일을 하는게 꼭 기분이 좋아야 한다고 예상하지도 않고요. 일하는 건 점점 더 쉬워졌고, 성적 욕구는 높아졌어요. 이건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수많은 정서적 애착을 지녀왔다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추측컨데, 지금은 개인적 감정과 (성 노동이) 약간 분리되어 있고, 이런 분리가 흘려보내는 걸 쉽게 만들었죠. The approach is very different [from sex in relationships], because when you are working you are going in there and you are not thinking about what’s good for you and what works and whether you romantically feel like doing this ... because you are not expecting to necessarily feel good about it. It actually [has] been much easier, my sex drive is now much higher ... It’s not that the other people I’ve been with in the past haven’t been good at it, that’s not the problem, maybe the fact that I’m having a whole lot of emotional attach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and I guess, I’m a little bit detached [in sex work] from that person emotionally, maybe that makes it easier to sort of let go. (Kate)" 나탈리 또한 케이트와 비슷하게 성적인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이 감정적 연결과 결부되어 있다는 지배적 담론에 저항해요. "때로 뭐 없어 보이는 남자가 개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sometimes the dorkiest looking guy can get you of". 이런 즐거움은 연애할 때보다 고객과 일할 때 더 많이 겪었대요. 키티는 유대-크리스트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대안적 사고 방식을 동양의 영적 담론에서 찾았어요. 고객들과 일할 때 탄트라(tantra)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면서, 그녀는 자기가 고객들을 계몽시킨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고객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자신 안의 '여성적' 측면을 건드리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유대-크리스트교적 접근이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섹스과 성적 즐거움에 대해 좁은 믿음을 촉진시킨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의 성노동을 받아들일 만한 고객을 찾기 위해 나름의 스크리닝 전략을 발전시키기도 했지요. '엉덩이로 해봤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라는 식으로 묻는 고객은 거르고, '키스할래요? 만져지는 거 좋아하나요?', '당신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라는 식으로 묻는 고객을 택하는거죠. 에이프릴은 성 노동에 10년 넘게 종사했어요. 키티와 비슷하게 성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배워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터에서의 섹스와 개인 영역에서의 섹스를 구분했어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섹스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열려 있어요. 사라는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적 믿음이 많은 성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전 여성들 중 다수가 내면화 하는 게... 창녀 같은 기분 혹은 기독교적 내용에 관한 기분이라 생각해요. 음, 수많은 사람들과 섹스하지 말라, 왜냐면 그것은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건 단혼제 같은 거고 한 배우자만 가지는 거고, 다른 사람과 섹스하는데 안 좋은 기분을 들게 하는 거죠. I think that most of the stuff that some of the girls internalize ... is just the stuff about feeling like sluts, or feeling like all that kind of Christian stuff. Um, that they shouldn’t be having sex with lots of different people, because that’s not a good thing for women to be doing. You know, but that’s stuff to do with like monogamy and then having a partner and then feeling bad about having sex with other people (Sara)." 감정과 정체성 공연 사만다는 20년 넘게 일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찾는 다수의 고객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과 고객들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자친구 혹은 여분의 아내 같은 느낌이에요. 고객들은 이혼, 사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겪는 동안 저와 함께 했어요.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고는 해요. A girlfriend, or you know, an extra wife, they’ve been with me through divorces, wives dying, lots of things, I’ve become, you know very, like family to them. (Samantha)" 사라는 어떻게 자신이 성 노동의 페르소나를 위한 개성 혹은 브랜드를 구성했는지 설명해요. 그건 섹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조작manipulating men'하기 위해서였어요. 성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기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마케팅 전략을 결정했죠. 생각해보니 전 젊어 보이고, 귀엽단 말이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이웃집 소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걸로 정했어요. 옷도 보수적으로 입고, 메이크업도 최소화 했죠 decided on a marketing strategy for myself and I think, for me I look very young and I look very cute and so I decided that my marketing strategy was going to be like girl-next-door kind of thing, so, um, I always dress very like, conservatively and um, wear minimal make-up. (Sara)" 비슷하게 릴리스는 자신의 성적 즐거움보다 대량생산된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말했어요. 예를 들자면 자신을 일터에서 어떻게 섹시하게 현시하는 가는 란제리와 같은 '유니폼'과 관련된 공연을 하는 거지요. 일터에서는 란제리를 입고 '섹시'한 모습을 공연하지만, 기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섹시함을 느낄 때는 편한 파자마를 입고 집에서 뒹굴거릴 때라고요. 체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일터의 기대가 자신이 무례한 고객들에 반응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그게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구자가 이런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터뷰 방법론 기법) 반응을 물어봤을 때, 가죽 오토바이 자켓을 지목했어요. "이 자켓이 좋네요. 왜냐면 '엿이나 먹어 남자들아' 하는 것 같잖아요 (폭소). 여기(사진)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제가 일터에서 어떠한가와 대비되요. 직장에서는 좀 여자처럼 굴어야 할 것 같지만, '나는 집에 할리데이비슨 타고 간다 남자들아. 난 빌어먹을 년이 아니라고!' 같은 거죠. I like the jacket because it’s a bit like, ‘fuck off, man’ (laughs). Most of the stuff here [in the photos] is the complete opposite to how I am at work, I guess you have got to be a little bit girly at work but, you know, ‘I’m going to ride on a Harley home, man, I’m no fucking girl!’ (Cherry)" 논의 원래 논의는 생략인데, 연구 주제나 제시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매매는 여자들에게도 좋다]식으로 쉽게 소비될 수 있다보니 살짝만 풀어볼게요. 앞서 주요 이론적 논의로 푸코가 주창한 자기배려의 윤리를 짚었었어요. 지배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자신을 위한 담론을 끌어와서 자신을 배려하는 실천을 조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논의겠지만 간단하게 적자면?). 그나마 난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적자면, 푸코의 자기배려의 윤리는 개인이 제한된 해방으로 나아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결코 담론의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능한 담론과 예속된 지식을 선택하고 고르는 걸 바탕으로 일종의 자율을 가능케 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자기배려의 윤리의 사례는 대량생산된/공장화된 친밀성의 예시를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들은 대량생산되는 형태의 친밀성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시연했어요. 본문에서는 옆집 소녀와 같은 페르소나를 연기한다는 사례나, 란제리를 입고 공연한다는 사례가 있었지요. 하지만 공장화된 친밀성은 몇몇 여성들이 연구에서 진술한 성적인 즐거움을 둘러싼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s과 교차해요. 몇몇 고객들을 오랜 세월 동안 만나면서 친밀감을 발전시키고, 이 친밀감에서 기인한 감정적 연결이 성적인 즐거움을 이끈다는 거죠. 이런 참여자들의 진술은 성 노동자들이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여성 섹슈얼리티가 감정적 연결에 기반한다는 기존 관념을 강화하기도 해요. 아 물론 본문에서 짚었듯이 (케이트처럼?) 여성의 감정적 유대와 성적 쾌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연결짓는 담론적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성적으로 '놓아준let go' 경우도 있었지요. 이런 제한된 해방의 사례를 통해 성노동은 여성이 기존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성 착취가 재생산되는 공간이 되어요. // 저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상세하게 나열했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교육수준은 어떤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등이요. 이런 접근에 대해서 딱히 배경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전 이런 모습들이 성 노동 여성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메세지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멜리나는 동물을 사랑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후로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성 노동을 했던 멜버른 매춘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40대 중반이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집 저당금을 다 지불하고,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웠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요. 아들은 그녀가 성 산업에서 일했다는 걸 모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낙인감을 고려하여 잘 설계되었고 (사진을 제시한 후 반응을 확인하는 일종의 로르샤흐 기법이라든지), 본문에 제시했듯이 여성 성노동자의 경험 연구가 낙인감 때문에 거의 연구되지 못했던 걸 고려하면 다소간 편의적인 표집인 듯한 부분은 방어 가능하다 느껴져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연구인데, 이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맥락을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성병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노동을 통해 얻게 된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성매매 관련 법은 어떤지 등등의 맥락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해줬으면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이니 아마 박사 논문에는 담겨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분석이 매우 정교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자기배려의 윤리가 단순히 [지배적인 담론의 힘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스스로를 위한 지식과 담론을 선택하여서 제한된 해방을 향할 수 있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지배적 담론과 가능한 담론들, 그리고 국지적/예속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더 파고드는 논의를 더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참여자들이 성 노동 경험에서 발견한 쾌락을 이 지역적 지식 중 하나로 제공하는 걸 보면, 인간의 체험을 지역적 지식이 생성되는 원천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체험조차도 담론에 의해서 어떻게 조형되는지는 약하게 고려한다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편이 마지막이네요. 성교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참 이 논문 가지고 그러니까 공창제가 낫다, 성매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 식으로 단순하게 소비하시면 노노해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1-03-08 22:08)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8
이 게시판에 등록된 소요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