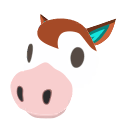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4/06/13 23:35:46 |
| Name | 하얀 |
| Subject | 집 |
|
평화로운 오후였다. 나는 병원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서 글을 읽고,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둘 다 회사와 육아에 동동거리는 삶에서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녁에는 아기랑 화상통화를 했다. 아기는 엄마 엄마 나를 부르고, 배가 아프면 배 위에 얹으면 된다고 알려줬던 납작한 거북이 인형을 내게 보여줬다. 내가 손으로 하트를 그리면, 아기도 웃으며 두 팔로 하트를 만들었다. 엄마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했다. 20살 이후로 병원에는 간간히 입원했었다. 큰 병이 있던건 아니였기에 대부분 혼자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병원에서 먹고 자는게 다인데 굳이 누군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몇년 전에 위경련으로 입원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굳이 와 볼 필요 없다고 했다. 언젠가 새어머니는 이런 가족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은 동생 아플 때 병상을 지켰다며…음…이 가족은 원래 이런데. 동생이 회사도 안가고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편하지 그지없었다. 내게 원 가족은 애정의 대상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독립의 대상이지 내가 머물 곳은 아니었다. 종종 아이를 낳기 전이 전생같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이다. 너무 옛날 일이고 내 생활은 완전히 변해서 기억도 희미하다. 그 희미한 기억 속의 내가 모처럼 병원에서 적적하게 있으니 떠올랐다. 나는 붕 떠 있는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그럴 듯하게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더 많은 세계를 보고 싶었지만, 완전한 이주를 위한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곳에 뿌리내리는 것은 두려웠다. 언제든 떠나고 싶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나 사막, 광활한 호수나 깍아지른 산을 늘 동경했다. 나는 어디서나 잘 잤고 잘 먹는 편이었고, 내게는 집과 여행지와 병원이 같은 곳이었다. 나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다.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 일년간은 느끼고 있었다. 차라리 완전한 이방인이 되기 위해 이 곳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병원 복도를 왕복해서 걸으며 아까 한 화상통화를 떠올리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내게 예전과 달리 돌아갈 장소가 생긴 것을. 내 아이와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아 그렇구나. 내게 비로소 ‘집’이 생겼구나…이게 ‘집’이라는 거구나. 내가 머물 곳, 나를 기다리는 곳,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주식을 하고 회사 성과급에 기뻐하며 가족과 함께 할 여행을 꿈꾼다. 모르겠다. 예전의 나는 너무 까마득한 과거로 느껴져서…경비행기를 타겠다고 저 먼 남쪽 끝까지 찾아가는 나는 사라지고, 아기에게 잘자라고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되었다. 26
이 게시판에 등록된 하얀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