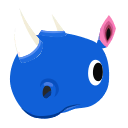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0/08/30 08:10:37 |
| Name | 최우엉 |
| Subject | 공장식 축산과 동물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 |
|
아래 오쇼 라즈니쉬님의 글과 댓글을 보고 여기저기 끼어서 댓글을 남기다가, 다른 분이 쓴 평화로운 게시글(?)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제 나름의 발제를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 먹는 문제에 있어 자신을 도덕적으로 옹호하려는 잡식인이라면, 동물을 먹기 위해 동물이 치르는 고통을 인식해야 하고, 그 고통을 동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아예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려면 모를까, 불필요하게 학대받지 않을 권리 등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공장식 축산의 산물을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식 축산은 (1) 그 침해의 수준이 전례 없이 극단적이고 광범위한데다 자기은폐적이고 (2) 단지 먹기 위한 침해가 아닐 뿐더러 (3)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한 침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공장식 축산의 광범위하고 극단적이며 자기은폐적인 동물권 침해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공장식 축산의 현실에 대해 알만큼 알고, 접할 만큼 접했으며, 채식주의자들의 장광설을 통해 충분히 들어왔다. 대중 역시 대체로 그렇고, 그러니 공장식 축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쓴 멜라니 조이는, 현대 축산체계가 대중에게서 밀집사육시설(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factory farm)의 실체를 대중에게서 감추어 비가시성을 획득하는 방어기제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공장식 축산이 비가시성을 통해 산업의 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대중은 자신들이 동물의 사체를 소비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알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동물을 소비하는 행위에 관한 규범판단을 행할 실질적 근거를 얻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드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젖소를 제품 뒤에 그려넣는 실체 없는 마케팅에 휘둘릴 뿐이고, 동물들은 인간의 연민에 호소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 지도 모르는 채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살을 존속시키는 일을 돕게 됩니다. 멜라니 조이는 비가시성을 실제적 비가시성과 상징적 비가시성으로 분리합니다. 상징적 비가시성은 자신이 먹는 육류와 먹히는 동물을 연결짓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도시인들은 대체로 돼지의 생태와 삶을 알거나 목격해 본 적 없으므로, 마트에서 포장되어 눈앞에서 조리된 동물의 사체와 돼지의 모습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먹을 때면, 다수의 한국인은 눈앞에 놓인 고양이 고기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친구네 고양이, 유튜브에서 본 고양이의 이미지를 결부시켜 그 고기에 일정 부분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불편한 감정에 대해 "돼지도 먹기 때문에 고양이를 먹는 것에 관한 불편한 감정은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먹히는 고양이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 뿐 아니라 돼지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논점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실제적 비가시성입니다. 실제적 비가시성은, 육류생산시설에의 접근불가능성으로 확인됩니다. 멜라니 조이가 제시하는 예시는 언론인 대니얼 즈워들링이 '구어메(미식가)' 지에 닭고기 산업에 대한 기사를 쓸 작정으로, 농장주들에게 닭 농장과 가공 농장 등을 돌아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의 답변은 상대가 채식주의자이기라도 한 듯 부정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수록된 기사 '어 뷰 투 킬'에서 즈워들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닭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으나 5대 닭고기 회사의 대변인들은 닭을 키워 그들에게 공급하는 농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도축장을 보여주는 일도 거부했다. 그들이 닭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고 싶었는데 말이다. 회사 간부들은 심지어 닭을 키우고 죽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어 멜라니 조이는 식육가공공장이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주에서 동물기업(animal enterprise) 내의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법으로 금한다는 점을 실질적 비가시성의 또다른 근거로 제시합니다. 언론매체의 동물기업 접근이 거부되기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영상은 대부분 몰래 조사하며 찍은 것인데, 2008년 동물보호단체인 미국인도주의협회(HSUS)가 잠입 조사를 통해 인부들이 병든 젖소를 쇠사슬로 묶어가 지게차로 뒤집는 장면 등을 알렸을 때 미국 역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또한 평상시에는 대중에게 알려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축산공장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동물보호활동가들의 잠입취재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의미에서 명성 높은 PETA가 한국 제주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었다면, 말고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경주마들이 어떻게 도축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눈앞에서 다른 말이 도축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말과, 그런 말을 도축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막대로 구타하는 등의 과정은 '도축장에서는 가스를 주입해 느낄 수 없게 만든 후 도축한다'는 일부 대중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 "경기 뒤 3일 만에 도축장으로…경주마들의 비극적 최후"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farm_animal/892574.html 경남 사천의 돼지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기돼지 망치살해 역시, '인간은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치게 하고, 다 자란 돼지를 먹으며, 어린 돼지를 성장시켜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라는 일부 대중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죽은 돼지들과 아직 죽지 않는 돼지들이 좁은 길에 쫙 깔린 채 순서대로 망치로 두드려 맞으면서 다리를 부르르 떨어대는, 이 '도태'의 과정은, 카라에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하루에 50-300마리 돼지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농장에서 일어나는 임의 선별과 잔인한 도태의 과정은 이런 내부고발자나 단체가 아니면 알려질 수 없으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것임에도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 "망치로 매일 수십 마리 아기돼지들을 때려죽이고 있는 대규모 공장식 농장을 고발했습니다. 돼지의 고통스러운 도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farm/read/10866 이런 사건은 실질적 비가시성의 불완전한 장막을 뚫고 등장하는 몇 가지 사실의 파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알 만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삶과 현실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동물학대의 현실을 알아두려 애쓰는 사람들도 결코 축산공장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만 연간 100억마리의 닭들이 살해당하고, 한국에서는 해마다 10억마리의 닭이 살해당합니다. 이 닭들 각각이 경험하는 고유한 삶과 죽음의 과정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통해 축산농장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잘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각 동물별 습성과 그 습성에 가해지는 제약, 폭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주로 멜라니 조이의 상기한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애써 간추렸고,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원서를 보시거나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다큐멘터리 도미니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미니언(지배자들) Dominion 2018 full documentary https://youtu.be/zqGFl2HIMXU — 돼지 : 돼지는 생후 3주가 되면 이름을 알아듣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훈련을 시킬 경우 코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80%의 타겟을 적중시키는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배를 긁어주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하루 50km를 뛰어다니며, 같은 집단 내의 돼지를 서른 마리까지 구별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출산을 앞둔 어미돼지는 아기 낳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느라 홀로 10km를 돌아다니다가, 장소를 찾으면 10시간동안 공을 들여 꾸미고 아기를 낳아 돌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내다 아기를 낳으면 낳은 아기를 데리고 본 집단으로 돌아갑니다. 사육 : (멜라니 조이는 미국을 기준으로 쓰고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도 대체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돼지들은 전 생애를 밀집사육시설에 갇혀 지내며 도축장행 트럭에 오를 때까지 한 번도 바깥 구경을 못 합니다. 아기 돼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취도 없이 거세되고 꼬리가 잘립니다. 꼬리는 뭉툭한 펜치로 끊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단면이 짓눌려 피가 덜 난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의 꼬리를 끊는 신경증 때문이고, 업계에서는 이를 돼지 스트레스 증후군(porcine stress syndrome)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인간의 PTSD와 흡사합니다. 붙잡혀 지내면서 독방 감금 등 다양한 고문을 당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돼지들은 자해를 하거나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때로는 하루에 수천 번씩이나 합니다. 많은 경우 배설물 가스로 인해 돼지들은 폐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기도 합니다. 다 자라 도살하기 알맞은 상태가 된 돼지들은 슈트(shute)라고 불리는 좁은 통로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도살 라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돼지들은 몰이꾼들에 의해 몰려 도축장으로 향하며 앞서간 돼지들의 비명과 생산 라인 작업자들의 고함을 듣습니다. 도축장 일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들이 피 냄새를 맡으면 앞으로 가려 들지 않지요. 돼지들을 제어기에 넣기 위해 채찍질하고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밤에는 몰이꾼이 화가 난 나머지 판자 조각으로 돼지의 등을 내리쳐서 부러뜨리더군요. 돼지를 움직이게 하려고 몰이에 쓰는 봉을 항문에 쑤셔 넣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돼지는 나한테 왔을 때 두 배는 더 난폭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싶은데 말이지요." 원칙적으로 가축들은 도살전 의식을 상실시키지만, 컨베이어 벨트 족쇄에 발목이 걸린 채 거꾸로 매달려 가는 돼지들 중에는 의식이 멀쩡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칼로 목동맥이 끊길 때까지 발부림을 치고 몸부림칩니다. 이 상태로 끓는 물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고, 대롱대롱 매달려 꽥꽥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 소 : 소들은 의사소통을 좋아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사교적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발성법과 제스처가 있으며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우정을 쌓곤 합니다. 소들은 천성적으로 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뜯고 되새김질하는 데 보냅니다. 송아지들은 어미젖을 빨지 않을 때는 서로 어울려 놉니다. 사육 : 마이클 폴란은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쓰기 위해 수소 한 마리, 534라는 번호가 붙은 육우의 일생을 추적했습니다. 이 소는 출산용 헛간에서 태어나 마취 없이 칼로 음낭의 아랫부분을 잘라내어 고환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세와 뿔 제거를 겪습니다. 이들은 이른 시기에 젖을 떼어 어미들과 강제 분리되고, 예비 우리를 거쳐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비육장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도살장에서 소들은 죽음의 통로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버티기에 일꾼들은 전기봉을 휘둘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밉니다. 돼지의 경우처럼 적지 않은 소들이 눈 뜬 채로 죽음을 겪습니다. 발에 사슬이 둘러져 거꾸로 매달리고, 피를 뽑히며, 내장이 들어내지고, 가죽이 벗겨내집니다. — 닭 : 반려로 키우는 닭을 유튜브로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닭은 붙임성이 좋고 주인과 같이 놀며 쓰다듬어주는 등 애정표현을 바랍니다. 무리 내에서 닭은 다른 개체들을 분별하고 서열에 따른 상대적 지위를 인식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닭과 가까이 있으려 합니다. 집에서는 개와 어울려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의 수명은 10년, 최대 20년 가량입니다. 사육 : 사육장에서 닭은 7주 내외의 생을 삽니다. 사육장은 닭을 최대 5만 마리까지 수용합니다. 밀집사육장의 포화도 탓에 닭들은 모이도 쫄 수 없고 횃대를 찾아 뛰어오를 수도 없습니다. 서로를 부리로 쪼는 정신병적인 행동 탓에 뜨거운 날로 부리 앞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멜라니 조이가 보고하는 미국의 경우, 닭은 가축을 의식이 없도록 만드는 절차를 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도살됩니다. 산 채로 목이 따이거나 털이 뽑히기 위해 끓는물에 입수됩니다. — 현대 공장식 축산은 더 많이, 더 싸게 먹기 위해서, 동물의 삶과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 동물을 노출시키고, 밀집사육과 무마취 신체절단과 불완전한 기절상태에서의 도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있는 법이 준법되고 있는지 감시되지도 않고, 은폐된 장소에서 농장 노동자들이나 농장주들이 어떤 종류의 폭력을 휘두르든간에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생애 전체를 고통 하에 두며, 그 동물이 낳는 동물의 삶마저 고통으로 만들어 고통의 반복을 영구화하고, 전지구적으로 매년 몇천억 단위의 동물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폭력의 명분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먹기 위한 죽음'인데, 동물의 고통 중 상당한 부분이 '식이'와 무관하거나 적어도 '먹기 위한 죽음'은 아닙니다. (2) 식이와 무관한 죽음, 또는 먹기 위한 죽음이 아닌 죽음 한국에서 망치로 얻어맞는 아기돼지들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농장노동자가 선별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몸을 비틀며 죽었습니다. 이 아기돼지들은 먹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좋게 봐 줘야 '먹는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채산성이 안 나오니' 죽은 겁니다. 그마저도 확실치 않지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 아무도 모릅니다. 도축장의 열악하고 과밀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지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사육장의 공기로 인한 폐질환, 밀집사육 스트레스와 무마취 절단으로 인한 감염으로 도축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은 동물들은 '먹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사육비용을 절감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그냥 죽는 겁니다. 수평아리들은 많은 경우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던져져서 산채로 갈립니다. 인간은 이 병아리들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없으니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먹는 과정'에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지언정 먹기 위해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40-60억 마리의 수평아리가 죽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수컷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갈려 죽는 거 앎?ㅠㅠ /스브스뉴스" https://youtu.be/UU7ca4Ooi4o 한편, 아예 식이용의 과정과 무관한 '입기 위한 죽음'도 일상입니다. 대체제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가격 또한 동물의 사체를 활용한 경우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잦은데, 어떤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질감'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보온성'을 위해 이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각종 모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앙고라 토끼 털을 입겠다고 토끼를 기둥에 묶어둔 채, 끔찍한 비명을 쉴새없이 내지르는 토끼의 털을 손으로 북북 뜯어내는 영상입니다. 어지간한 영상에는 굳이 주의 표시를 달지 않는데 이 영상은 심각하므로 주의하세요. — The Truth Behind Angora Fur [잔혹 주의] https://www.youtube.com/watch?v=PtAFHyXS31M SBS와 KOTTI가 시행한 실험에 따르면 거위털, 오리털, 웰론의 보온성은 3-4%p 차이이며, 복원성의 경우는 웰론이 더 우수하다는 실험까지 있는데, 새들의 털을 입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5-15회에 걸쳐 거위와 오리의 털을 산채로 북북 뜯어댑니다. 롱패딩 한 벌을 만드는 데 오리나 거위가 일생동안 생산하는 털 20마리분이 필요합니다. 양모의 경우에는 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고환을 잘라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겨울은 거위에겐 '죽음의 계절'...구스다운 롱패딩 한 벌에 20마리 산 채로 털 뽑혀"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48 — SBS "[취재파일] 패딩, 3%의 보온성 차이에 1,000%의 가격 치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7769 — JTBC "산 채로 털 뽑히며 발버둥…구스다운 '거위들의 비명'" https://youtu.be/Y8TbkR7qJt0](https://youtu.be/Y8TbkR7qJt0 —"PETA Asia’s Latest Findings of Cruelty in the Australian Wool Industry" https://youtu.be/TOt3EWbbM1s](https://youtu.be/TOt3EWbbM1s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연간 410만톤입니다. 단체급식 등을 시행하고 남아 버리는 육류, 식당에서 버려지는 육류, 개인이 버리는 육류, 심지어 농업과정에서도 일정량의 동물들이 희생당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동물들은 '버려지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저는 비건이 되기 전에도 동물의 사체는 남기는 것을 금기로 여겼지만 이런 실천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흔하겠지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은 먹기 위한 동물들에게도 주어지고, 먹히지 않는 채 죽음을 맞는 동물들에게도 주어지며, 입혀지는 동물들에게도 주어지며, 버려지는 동물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먹기 위한 죽음이라는 정당화 자체도 의문에 부쳐져야 할 일이지만, 일단 모든 동물들이 먹혀지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고통받거나 죽어간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다른 동물학대는 금기시하는 사람들조차 먹는 것이 연관된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걸까요? 이 생각은 주로 생존이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 육식과 건강의 통념 이 게시판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비건은 자기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통념은 안티비건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이 통념은 대개 MBC가 만든 열댓명의 채식인을 표본 삼아 만든 영상과 EBS '명의'에 등장하는 고지혈증을 앓는 스님의 짤로 지지됩니다. 그러나 영미를 대표하는 영양학 전문가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영양학자가 아닌 데다, 이 문제는 길게 다뤄질만한 핵심 논점도 아닌 듯하니 짧막한 링크들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t is the position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that appropriately planned vegetarian, including vegan, diets are healthful, nutritionally adequate, and may provide health benefit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s. (적절히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비건 식단을 포함하여-은 건강에 좋고, 영양학적으로 적합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이점을 줄 수 있다.)" — Position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Vegetarian Diets https://pubmed.ncbi.nlm.nih.gov/27886704/ "One of the UK’s longest-standing organisations that represents dietetics and nutrition, the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has affirmed that a well-planned vegan diet can “support healthy living in people of all ages” in an official document signed by its CEO." —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confirms well-planned vegan diets can support healthy living in people of all ages https://www.bda.uk.com/resource/british-dietetic-association-confirms-well-planned-vegan-diets-can-support-healthy-living-in-people-of-all-ages.html 육식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째서 '먹기 위함'이 동물에게 그 모든 고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표준 한국인이 육식을 할 이유 중 남는 것은 미각적 쾌락의 문제 뿐입니다. 이제 '먹기 위해 폭력을 가한다'는 이 문장은 바꿔 말해 '쾌락을 누리기 위해 폭력을 가한다'가 됩니다. 내가 미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 축산공장 동물이 치러야 하는 고통을 저울에 올려두고 본다면, 그 차이는 현저할 것입니다. 일년에 열 네 마리의 닭을 먹는 표준 한국인이라면, 열 네 끼의 쾌락을 위해 열 네 번의 생이 황폐화되고 비참한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열 네 번의 끼니를 위해 도합 140년의 수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닭들이, 밀집사육장에서 약 98주(7*14)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의 추는 동물복지 육류를 선택한다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겁니다. 물론 '고기를 포기했을 때의 상실케 되는 미각적 비용' 또한, 지배적 문화로서의 육식문화에 의해 그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잡식인은 채식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법을 모르고, 채식 식당에 자주 방문하지 않으며 레시피를 찾아보지도 않으니 채식 재료를 응용하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도 모릅니다. 적어도 폭력의 절차를 극단화하는 공장식 축산의 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일종의 불매운동 경향이 짙은 페스카테리언(생선만 먹는 부분채식주의자)이나, 외부에서는 육류를 먹고 집에서는 채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최우엉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