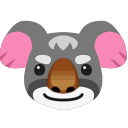| Date | 22/01/12 14:16:29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인구절벽발 노동인력 부족 우려는 과장인가 |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고, 한국의 인구구조를 (더 약하게) 선행하는 일본이 인구절벽발 노동공급 급감으로 구인난이 오다보니 한국도 지금 일본처럼 곧 일할 사람 부족해진다는 소리가 종종 나옵니다. 안그래도 쪽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중이라 더더욱. 물론 위 주장에 반박도 많습니다. 노동수급, 구직난/구인난여부는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이 구인난이 온 건 (현재 한국에 비해) 자동화가 덜 되어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느리게 줄어든 탓이라, 자동화가 더 된 한국은 다를 수 있다, 일본은 경제활성화정책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났기에 한국은 그게 없다면 수요 증가발 구인난은 안 올 것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리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구인난 온다는 주장의 진짜 문제는, 노동수요까지 갈 것도 없이 인구절벽으로 한국의 노동공급이 급감한다는 주장조차 사실 과장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노동공급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총량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0.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실제 경제활동인구가 중요하다 흔히 인구절벽 논의를 들고 올 때는 생산가능인구와 그 비율, 그러니까 15-64세 인구와 이의 총인구대비 비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에 정점 찍었다, 앞으로 50여년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난다. 비율도 73%에서 50%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선진국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이 된다... 그 자체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공급 급감과 구인난을 논하려면 연령도 15-64세로 한정하고 고용여부에 무관하게 연령 모두를 퉁친 생산가능인구보다는 연령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에 한정한 경제활동인구 지표가 더 정확합니다. (이철희 2021) 생산가능인구가 많아봤자 실업문제가 심각해 백수가 넘쳐나면 노동시장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에 없더라도 내수시장에선 소비자일 수 있지만, 이들의 금전형편을 생각하면 내수시장 기여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노인 인구도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상황이라, 연령제한을 한 생산가능인구 지표의 한계는 더 큽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기계발보다는 생계용 노동이 많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유 자체는 나쁩니다. 그러고도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고령층 생산성도 나쁘고요. 다만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노동공급 감소세가 유의미하게 더 완만해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경제활동인구로 봐도 얄짤 없이 급감하지만, 적어도 향후 20년은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그리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1. 생각보다 중후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사이즈 흔히 한국의 쪽수많은 전후 출생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하고. 주로 1955-1963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출산율이 6 정도였고, 출생아 수도 연간 100여만명 가량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기준이 1963년에서 끊기는 건 1964-67년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산아제한정책 등으로 꾸준히 줄다보니,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어나야 한다는 베이비붐 세대 개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대 개념은 사회문화적/정치적 경험과 관련되는 개념이기도 해서, 1963년생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인구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기준이기도 합니다다. 해외 선진국의 베이비붐 이론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할 때가 기준인데, 한국은 당시 최빈국 수준으로서 출산율과 인구상승률이 매우 높아 출산율은 줄어도 출생아 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만한 연령대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한국의 1964-1974년생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출산율은 6명에서 4-5명 정도로 줄었는데 출생아 수는 그 전의 1955-1963년생과 비슷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 해 90만명 이상이 태어난 전무후무한 쪽수를 지닌 세대의 존재성을 생각하면 쪽수 기준으로는 1955-1974년생 통째를 베이비붐 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파란색이 여간 출생아수고 밑의 빨간색이 사망자 수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중후한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은퇴한다고 곧 심각한 노동공급 부족이 온다는 주장이 과장임이 확실해집니다. 이들이 전부 은퇴한다고 해도 쪽수가 큰 1964-1974년생이 기업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노동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지점은 최소 1974년생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무렵으로, 그때까지 대략 15-20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은 노동공급 부족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베이비붐 은퇴발 노동공급 부족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다는 전망은, 쪽수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개념의 확장을 제안한 학자들의 일관된 논평입니다. (김용하·임성은 2011; 최슬기 2015; 홍춘욱·박종훈 2019) 2.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로 청년세대 감소효과 상쇄 각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를 구한다음 고용률을 곱하고 다시 더하면 그 수치가 경제활동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크게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0년은 코로나 효과가 있어 2019년을 대신 이용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 불과하지만 40대는 78.4%, 50대는 75.4%에 달합니다. (KOSIS 통계청) 따라서 청년인구 감소 시, 생산가능인구보다 경제활동인구는 느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동인구 감소에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이철희 2021)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1970년대생 이후 세대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거든요. 물론 이는 청년실업의 극심함도 한 몫 합니다만, 이미 주된 일자리를 구했고 안정된 중장년의 고용률이 막 사회진출을 한 청년층보다 높은 건 어느정도는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고학력화+ 긴 징병제 복무기간 + 고시제도 등의 n단콤보로 사회진출이 매우 늦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인구절벽 부작용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건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낮아져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청년층을 많이 고용하는 신진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에서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효과는 고학력화 효과로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가 나쁜 방식으로 유지되더라도 이는 '총량'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세부 업종/지역/노동연령대별로 희비가 많이 갈리는게 문제지만. 3. 인적자본 향상 - 양의 감소를 상쇄하는 노동인구의 질적 개선 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국은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 격차가 어마어마하고, 따라서 세대가 교체되며 평균적 인적자본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페널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질 향상으로 메꾸거든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했기에, 이 인적자본 개선 효과가 특히 큽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유별나게 심한것만큼이나 한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잘 언급되지는 않더군요. [출처: Jeong (2019)] 교육수준 향상은 두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전형적인 개도국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장년층 이상과, 선진국에서도 제일 학력수준이 높은 청년세대가 공존하는 게 한국입니다. 물론 그 고학력을 위한 스트레스와 행복도 저하, 입시교육과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노동시장에서의 고학력자 저활용 등은 분명 문제이지만, 성취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수준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명은 급속도로 올라가 2020년 83.5세로 OECD에서도 최상위권까지 올라갔고 (통계청 2021) 건강수명도 73세에 달해 일본 싱가포르 바로 다음입니다. (WHO 2021)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적자본의 대리지표로 쓰이는 키의 경우, 만 17세 기준으로 200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최소한 1980년대생까지는 건강측면 인적자본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김두얼 2022) 인적자본 증대 효과는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 일정부분은 상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고령화발 생산성 감소효과를 인적자본 증가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령화와 인적자본 개선효과를 동시에 측량한 논문들이 셋 있는데(Kotschy and Sunde 2018; Han and Lee 2020; 이철희 2019), 놀랍게도 셋 논문 모두 한국에서는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 효과보다 인적자본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우선 Kotschy and Sunde (2018)을 봅시다. 이 논문은 2010-2050년 사이 노동자당 생산성을 예측하고, 이를 인구구조와 인적자본(교육수준)을 2010년에 각각 혹은 모두 고정시킨 가상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인구구조(고령화)와 인적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본 바 있는데요. 한국은 재미있게도, 한국은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OECD 국가 중 제일 큰데, 인적자본 향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 효과도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큽니다. 고령화와 인적자본 효과를 모두 감안하면 양 극단의 효과가 상쇄되어 약간의 (+)가 되고, OECD 평균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 주변 순위에 뉴질랜드, 체코, 아일랜드, 헝가리가 있는데, 넷 모두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덜하나 인적자본 향상효과가 한국보다 낮아서 비슷한 순위가 된 셈입니다. 진짜 고령화 효과가 인적자본 효과보다 강해 생산성이 (-)가 되는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폴란드같은 나라입니다. 이 국가들은 고령화는 덜할지 몰라도 인적자본 향상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약해서(셋 모두 과거엔 한국보다 잘 살았고, 교육수준도 높았죠. 지금 교육수준은 한국보다 낮을 거고) (-)입니다. 이건 Han and Lee (2020)입니다. 고령화와 고학력화 효과를 모두 합산한 인적자본발 생산성 증가분이 2020-2040년까지 변화하는 걸 보자면 2020년대엔 매년 0.4-0.6%가량이고, 2030년대엔 상승폭이 점점 작아져 2040년쯤엔 0.1%까지 떨어지나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2030년대엔 노동인구 감소분이 매년 -1.5%에 달해 인적자본 향상만으로 노동인구 감소를 전부 상쇄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만, 적어도 노동인구 감소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추세를 보니 2040년대 이후로는 인적자본 상승효과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법합니다만. (그땐 대학진학률 70% 미만 세대는 다 은퇴할 시점이라 더 고학력화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2019). 인적자본 대 고령화 내용은 물론 글의 주제를 요약하는 그림입니다. 2042년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대비 74%에 불과해 23년 새 26%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진짜 중요한 경제활동인구는 86% 수준에 머물러 23년동안 14%로 감소폭이 줄어듭니다. 더불어 생산성을 감안한 경제활동인구, 즉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2042년에도 2019년의 92% 수준이 유지되어, 23년동안 8%만 감소합니다.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생산성을 감안한 경제활동인구(즉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로 가면서 노동인구 감소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065년이 되면 2019년대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질임금 총액이 각각 51%, 43%, 40%(2042년까지는 26%, 14%, 8%)씩 줄어들어 큰 문제가 되므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만 그 시점은 보다 먼 미래입니다.. 적어도 20년동안 경제활동인구, 실질임금 총액 기준 노동인구는 10% 남짓 감소하는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건 기정사실이니 분명 페널티가 되겠지만, 자동화 등 노동수요 대응수단을 생각하면 당장 구인난이 닥칠 정도의 변화는 아니에요. 출처: Jeong (2019) 덤으로 이런 고용률, 인적자본 변수를 고려하면 급격히 악화되는 인구부양비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Jeong(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국은 연령만 감안한 고전적 인구부양비(d_P)에 비해 고용률을 감안한 인구부양비(d_E), 인적자본까지 감안한 인구부양비(d_H)는 더 천천히 감소해왔고, 90년대 중반 이후 개선이 없는 d_P와는 달리 d_E, d_H는 느리게나마 개선되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을 감안하면 위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d_E, d_H기준 인구부양비는 우리가 알던 d_P보다 느리게 악화될 것입니다. 4. 고용률, 생산성의 추가적 개선 잠재성 위 Kotschy and Sunde(2018), Han and Lee(2019), 이철희(2019)의 추계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과 상대적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고용률이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위 결과보다도 더 나아집니다. 한국은 특히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 여성과 장년/고령층의 생산성이 낮다보니 이쪽의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와 실질임금 총액 부족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게, 역설적으로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잠재력으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이철희(2021)에 따르면, 1)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 일본의 여성차별/전통적 여성관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재 일본의 여성고용률은 구인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등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제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악명높은 M-커브(결혼/출산 등으로 해당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이 인접 연령대에 비해 낮은 현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 급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간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2019년의) 92%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2) 여성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남녀격차 해소, 경력단절 완화 등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7%까지 올라갑니다. 3) 장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 일본 급으로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간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4) 고령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무려 99%까지 상승하고, 2065년의 임금총액도 62%에서 70%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각각의 정책효과일 뿐이고 합산하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M커브 완화, 장년 근로자 조기퇴직 감소가 동시에 실현되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7~98%까지 상승합니다. 네 정책 모두 실현하면 2042년에 임금총액은 지금의 100% 이상이 되어, 생산성 고려한 경제활동인구는 20년 뒤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위 시나리오는 가능성으로 남아있지만, 한국의 고용률은 과거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있을 정책과 결부되면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1.5%에서 66.8%까지 5.3%p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8.5%에서 60.9%로 2.4%p 증가했고.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돋보입니다. 50대 고용률은 66.5%에서 75.4%로 8.9%p, 여성 15-64세 고용률은 50.1%에서 57.8%까지 7.7%p 증가했습니다. (다만 20대 고용률은 60.2%에서 58.2%로 오히려 2%p 줄었는데, 이는 국가정책의 숙제로 남을 겁니다) (KOSIS 통계청) 여성, 고령층의 상대적인 생산성도 느리게나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시간당 평균임금은 2006년에는 남성의 60.6%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69.4%까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2020) 60대 이상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06년에는 임금이 제일 높은 40대의 60.4%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73.7%까지 증가했습니다. (KOSIS 고용노동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추세는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노동가능인구 감소와 여성/고령 생산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내놨고, 앞으로도 내놓을 겁니다. 따라서 위 고용률/생산성 효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희 교수 말로는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글과 인용자료에서 이민 확대정책은 언급이 아예 없는데도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된다면 더 개선될 수도 있어요. 결론 위에서 깊이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인구절벽으로 당장 구인난 닥칠것마냥 외치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몇몇 업종과 지역, 인력 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구인난은 가능하겠지만, 업종과 지역, 인력 유형을 막론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일본의 현상은 적어도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2019)에서도 2018-2028년 사이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60만명 줄어드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을 감안해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그보다 190만명 적은 70만명만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거꾸로 10년동안 124만명이 더 증가합니다. 노인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공급 정책을 세울 땐 지나치게 조급해지지 말고, 정책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필요도 없는데 부작용만 꽤나 큰 정책을 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정년연장입니다. 얼핏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수인 정책 같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노동공급 부족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서, 어설픈 정년연장 정책(임금피크제가 없다던가 호봉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던가)은 청년 일자리만 잠식하기 십상인데다 정년연장 주 수혜층은 중견기업 이상의 고급 노동자에 한정되며 정년이 안 지켜지거나 정년과 무관한 중소기업/자영업 장노년층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투성이인 정책입니다. 또, "곧 일본처럼 구인난 올텐데 청년실업 정책할 필요 있나?"같은 나이브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구인난 올 일도 없는데 그런 마인드는 청년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거에요. 20년동안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인구 문제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아니라 업종/지역/인력 유형별로 벌어지는 노동수급 불평등 심화에 있습니다. (이철희 2021)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돋보이기 때문에, 노동인력 고령화는 고학력효과로 상쇄한다 해도 청년인구 활용도가 높은 직종은 당장의 인력수급에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은퇴할 연령대가 많은 직종도 비슷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별로도 희비가 꽤 크게 갈릴 것이고요. 미국에서 수많은 업종에 코로나19발 구인난이 왔고, 한국은 극심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등의 업종은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벌어졌는데 이런 양극화가 20년동안 전 직종에서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효율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이민자 유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노동인구 측에서는 향후 20년은 괜찮다는 거지, 50년 100년 뒤에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에 유념해야 합니다. 204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 총임금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년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어...어...? 하다가 정책을 세울 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때면 감소세가 굉장히 가팔라져서 왠만해선 멈추기 힘들거든요. 물론 30년 이상의 먼 미래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빗나간 인구예측, 기술변화 등으로), 그건 제대로 대응했을 때 이야기고 아무것도 안하면 분명 큰 댓가를 치릅니다. 위에서 말한 고용률, 생산성 향상 정책은 물론이고 출산율 정책, 해외이민 유입 등 다면적인 정책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본 글은 https://kongcha.net/news/26622에 착안해 인터뷰 요지를 구체화해본 것입니다. 기억하는 논문 찾고, 자료 찾고 스캔하고 첨부하고, 그래서 글 다 완성하는데 거의 10시간 걸렸네요. 쿨럭. 참고문헌 Han, J.-S., & Lee, J.-W. (2020). 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53, 100984.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1-24 21:27)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4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르스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