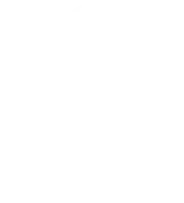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18/08/18 21:24:26수정됨 |
| Name | nickyo |
| Subject | 나는 술이 싫다 |
|
나는 술이 싫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를 머그컵에 담아두고 꿀떡, 꿀떡 한 모금씩 씹어삼킨다. 오늘의 계획은 꽤 성공적이다. 기출문제 500문제 풀어야지, 하고 다 했다. 와, 뿌듯하네. 라고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영 뿌듯하지가 않다. 내일은 시험이니까 일찍 자야지. 목숨 걸고 꼭 붙어야 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한 번에 붙고 싶다. 물론 합격할 만큼 충분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시간 내에서는 틈틈이 요령껏 했다. 그러고보니 시험에 합격했던게 언제더라.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온통 불합격이다. 과락이 뜰 때도 있었고, 아쉬운 점수로 낙방할 때도 있었다. 그나마 시험은 불합격을 쉽게 알 수 있다마는, 그 사이에 봤던 면접들은 아리까리한 희망을 주곤 했다. 그치만 전부 불합격이었다. 이 느낌을 안다. 몹시 익숙하다. 새벽 몇 시까지고 잠들지 못할거라는 확신이 선다. 아버지의 소주를 꺼낸다. 또 한 병 사다놔야겠다. 아버지가 눈치 챘을까? 잘 모르겠다. 꽤 여러병의 소주를 훔쳐 마셨다. 어지러울 만큼만 술을 마시면 일단은 잠들 수 있다. 다행히 숙취가 별로 없는 체질이라, 시험에 큰 지장은 없을것이다. 엉뚱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영국의 어쩌구 저쩌구 대학에서는 공부하고 술먹으면 기억이 오래간다고 했던 것 같다. 굳이 찾아보지 않고 믿어야겠다. 꿀떡, 빈 속이 찌르르 쓰리다. 복학하고 나서 했던 학생조직은 참 즐거웠다.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 아래 무척 바빴던 기억이 난다. 공부보다는 노는게 더 바빴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때로는 마음대로 잘 안되는 사람들에게 속상함도 야속함도 있었지만 어떤 테두리 안에서 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쓰라림도 실패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 둘 자기 갈길을 찾아가고, 나 역시 내 갈길을 찾아 나섰다. 그 때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할까? 잘 모르겠다. 큰 방황도, 큰 일탈도 없이 적당한 10대를 보냈다. 야자를 짼다거나, 독서실에 가서는 피시방으로 샌다거나. 내 일탈은 딱 그정도였다. 모난 곳 없이 특별함도 없이. 지금 떠올려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그렇게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 때로는 괴롭힘도 당했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았고, 늘 어딘가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눅든 시간이 많았다. 어렵게 만든 친구들이 떠날까 전전긍긍했던 기억도 나고, 무턱대고 잘 해줘야 겠다는 강박과 눈치에 시달리던 것도 기억난다. 그러나 그래도 그땐 괜찮았다. 스물 초반 언저리도, 중반도 다 괜찮았다. 일주일에 알바를 3개씩 돌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일주일에 이틀은 잠을 못자가며 학비를 벌어도 괜찮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였어도 금방 일어났고, 남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내 할 일을 찾았다. 때로는 슬프고 우울한 날이 있었고, 때로는 죽고싶을만큼 괴로운 적도 있었지만 그게 늘, 항상 공기처럼 떠있지는 않았다. 그런 날에는 글을 쓰고, 걷고, 밤하늘을 구경했다. 그러면 금방 괜찮아졌다. 그 때는 술을 싫어하면서도 술을 잘 마셨다. 으레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만큼은 술이 그렇게 싫지 않았다. 다행히 술이 몸에 잘 받는 편이라,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며 술을 마셨다. 게다가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때로는 좋기도 했다. 기쁜 일이었다. 단골 술집의 벽면에는 내 이름이 몇 군데 적혀있다. 좋은 사람들이 적어준 그 벽의 낙서가 문득 보고싶다. 그렇게 잘 지냈었다. 하나 둘 떠나간 것은 오랜 일이다. 그러나 어쩐지 지금에 와서야 이토록 허전한걸까. 좋은 친구가 많았었는데 편히 아프다고 말할 이는 없다. 사실 나도 내가 이렇게 된 걸 잘 모르겠으니 내가 어떻다고 설명할 도리도 없다. 후르륵, 컵의 바닥이 드러난다. 다시금 술을 채운다. 이를테면, 이 술컵같다고 생각했다. 다 마시고 난 뒤에도 코를 울리는 알콜향처럼, 언젠가부터 늘상 가볍게 억눌려 있는 느낌. 패배감, 외로움, 무기력함. 잠깐씩 괜찮아 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발 밑이 쑥 꺼져간다. 낮에 공부를 마치고 물을 꺼내 마시는데 어머니께서 손을 씻으시며 말했다. 더운데 공부하는 것도 못할짓이여, 아들은 살도 빼야하는디. 물소리 사이로 나도 모르게 조그맣게, 그럼 죽지 뭐. 하고 조건반사처럼 입 밖으로 괴상한 소리가 빠져나갔다. 내가 한 말인가? 세면대의 철벅거리는 물 소리사이에 묻혔을거라는 초조함으로, 이제 날이 시원해져서 운동도 할만해유. 하고 어머니 고향의 사투리를 가져다 괜시리 크게 말을 던진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청도 산골, 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도의 하천 앞 마을, 나는 서울 한강 근처의 어느 연립주택. 낡기는 했어도 서울의 강 이남 아파트에 살게 된 건 온전히 강인한 부모님 덕이다. 나는 부모님의 억척스러움도, 포기 않는 근성도 물려받았을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 찾아서 쓸 래야 쓸 수가 없다. 술을 마시다 보면 어지럽기 전에 생각이 잘 안이어질때가 있다. 그게 좋았다.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것도 지치는 일이다. 받아들이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지나고 나니 별 일 아니라는 생각이다. 좋은 일들을 떠올려보고, 슬픈 일들도 떠올려본다. 술을 꿀떡, 한 모금 더 넘길때마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뒤죽박죽이다. 그땐 그랬었나, 이건 언제였지. 저건 누구였지. 현실감각이라곤 하나 없이 그런 일이 있었나. 몽롱하다. 텅 빈 페트병을 구겨서 방 구석 서랍에 넣는다. 재활용품 할 때 몰래 내놔야지. 대신 새 소주병에서 머그컵 한 잔을 가득 따르니 딱 적당히 남는다. 이정도면 되겠지. 무너지는 것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집은 아파트만 낡은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낡아버렸다. 부모님을 이룬 철근은 너무 오래 혹사당했고, 동생은 어쩐지 건축물을 세울 생각조차 없어보인다. 나는 기둥과 철근에 나무도 엮고 흙도 바르고 벽돌도 쌓고 시멘트도 부었던 것 같은데 어쩐지 나무는 썩어있는 것 같고 흙은 모래처럼 바스라진, 얼기설기 벽돌의 틈새로 꾹꾹 밀면 금세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모두 어쩌면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위태로운 상태 속에서는 한 쪽이 무너지는 순간 끝이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끝이고, 내가 무너져도 끝이다. 몰래 술을 마시고 방문을 닫고 잠들면 아무도 모른다. 그 밤은 외면해야할 밤이다. 알게 되더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밤. 그러고보면 체온을 그리워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온도를 달가워했던가 하고 생각하면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썩 유쾌했던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처음 했던 키스나, 작은 스킨십들도 그 때 뿐이었다고 기억한다. 뭔가 대단히, 그게 늘 그립고 바라던 일은 아니었던것 같다. 그랬었는데 어느날부터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때 만큼은 묘하게 안심할 수 있었고 평화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갈증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일인지는 더더욱 모르는 일이었다. 방황하려 하는 발걸음을 끌어 당겨 제 길 위에 둔다. 수 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괜찮다는 말로 버텨봤다. 버티는 것 만큼 익숙한 일도 없었지만,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역시, 이유를 알 도리가 없었다. 약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설거지통에 술냄새가 밴 머그컵을 두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컵 위로 쏟아져 이내 넘쳐흘렀다. 싱크대로 물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았다. 어지러움에 두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기대었다. 후우, 어디서부터 끌어올렸을지 모를 깊은 한 숨이 쏟아져 싱크대의 배수구로 빨려들어간다. 잘 수 있겠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입가로 새어 속옷을 적셨다. 냉장고를 닫고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방 문을 닫고 조심스레 매트리스 위로 몸을 누인다. 목에 좋다는 베개를 바른 자세로 벤다. 깜깜한 천장이 빙빙 도는 것은 기분 탓일테다. 기분 탓이라면, 이대로 빙빙 돌다 어딘가의 배수구로 빨려들어가 그렇게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하수구를 빙빙 타고, 어딘가의 정화조에 곤죽이 되어 철푸덕 하고, 형체를 알 수 없이 온 물에 둥둥 조각나 떠다니는 곳에 나는 없을 테였다. 있으나, 마나 아니냐. 하고 소리내 웃었다. 입술 사이로 괴상한 소리가 함께 웃는 듯 했다. 이내 깜깜이, 깜깜이, 멀어진다. 아, 혼자 마시는 술은 늘 이렇게 싫단 말이야. 이런걸 왜 마시나 몰라. 이해할 수가 없네. 진정 이해 못할 것은 술인지 나인지. 그런 생각도 슬그머니 빙글, 빙글, 빙글 빨려들어가고, 조용한 쌕쌕이는 숨소리만 가득하다. 조용히, 밤이 지나간다. * Toby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8-28 11:08)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