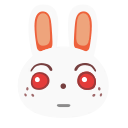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18/04/10 19:43:22 |
| Name | Eneloop |
| Link #1 | https://youtu.be/5dNbWGaaxWM |
| Subject | 슬라보예 지젝과 정치적 올바름 |
|
모처럼 마음에 드는 영상이라 (링크 1) 짧은 영어로 해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오역이나 더 좋은 해석이 가능하신 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말씀해주신다면 수정 진행하겠습니다. -------------------------- Of course I have nothing against the fact that your boss treats you in a nice way and so on. 당연히도, 실제로 당신의 보스가 잘 대해주고 있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어요. The problem is if this not only covers up the actual relationship of power but makes it even more impenetrable.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 권력관계를 덮어줄 뿐 아니라, 아예 권력관계를 흠집내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You know, if you have a boss who is up there, the old fashioned boss shouting at you, exerting full brutal authority. 만약 당신한테 소리치고, 폭력적인 권위를 표출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In a way it’s much easier to rebel than to have a friendly boss who embraces you or how was the last night with your girlfriend, blah, blah, all that buddy stuff. 그런 고전적인 상사들은, 당신을 친근하게 대해주고, 밤에 여자친구랑 잘 보냈냐, 그런거 물어보는 친근한 상사들보다 반항하기가 쉽습니다. Well then it almost appears impolite to protest. 친근한 상사들의 경우에는 저항하는 것이 예의없어 보이게 되죠. But I will give you an example, an old story that I often use to make it clear what do I mean by this. 이런 경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종종 언급하는 오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Imagine you or me, I’m a small boy. It’s Sunday afternoon. My father wants me to visit our grandmother. 당신이나 제가, 작은 소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일요일 오후에요. 아버지는 제가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Let’s say my father is a traditional authority. What would he be doing? 아버지가 고전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He would probably tell me something like I don’t care how you feel, it’s your duty to visit your grandmother. Be polite to her and so on. 아버지는 보나마나 “너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경 안 쓴다. 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것은 네 의무이다.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Nothing bad about this I claim because I can still rebel and so on. It’s a clear order. 이런 경우는 명확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장에 반박하고 반항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But what would the so called post-modern non-authoritarian father do? 하지만 소위 포스트모던한 비권위주의적 아버지들은 어떠하죠? I know because I experienced it. He would have said something like this.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You know how much your grandmother loves you but nonetheless I’m not forcing you to visit her. You should only visit her if you freely decide to do it.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하지만 꼭 할머니 댁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단다. 자유롭게 결정해서 가도록 해.” Now every child knows that beneath the appearance of free choice there is a much stronger pressure in this second message. 모든 아이들은 알겁니다.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외연 안에 더 강한 압력이 놓여져있다는 것을요. Because basically your father is not only telling you you must visit your grandmother but you must love to visit it. You know he tells you how you must feel about it. It’s a much stronger order.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반드시 할머니댁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조차 어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이건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for me almost a paradigm of modern permissive authority. This is why the formula of totalitarianism is not – I don’t care what you think, just do it. This is traditional authoritarianism. 그리고 저는 이것이 현대사회가 가진 관대한 권위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주의자의 공식이 “난 니가 어떤 생각을 하든 관심 없고, 그냥 해”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건 고전적인 권위주의에요. The totalitarian formula is I know better than you what you really want and I may appear to be forcing you to do it but I’m really just making you do what without fully knowing what you want and so on. 전체주의자들의 논리는 “내가 너보다 잘 알고, 니가 뭘 원하는 지 알아. 내가 너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거야. 너가 모를 뿐.” 뭐 이런 거죠. So in this sense yes, I am horrified by this. Also another aspect this new culture of experts where an injunction is presented just as a neutral statement. 그리고, 이런 견지에서, 네. 저는 이런게 무섭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새로운 문화가 가진 또다른 측면들은, 명령이 중립적인 명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For example, one example that I like and let’s not have a misunderstanding here. 제가 좋아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텐데요. 오해를 피하고 싶네요. I don’t smoke and I’m for punishing tobacco companies and so on and so on. 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오히려 담배회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편입니다. But I’m deeply suspicious about our phobia about smoking. I don’t buy it that this can be really justified just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how cigarettes hurt us and so on and so on. Because my first problem is that most of the people who oppose smoking then usually are for legalization of grass and so on and so on. 하지만 저는 흡연에 대한 우리의 공포증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이런 것들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흡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하곤 하거든요. But my basic problem is this one. Look, now they found a more or less solution – e-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제 기본적인 논지는 이겁니다. 보세요. 이제 새로운 해법이 나왔어요. 전자담배라는 것이죠. And I discovered that now big American airline companies decided to prohibit them. And it’s interesting to read the reason why. The reason is not so much that it’s not yet sure are they safe or not. Basically they are. 그리고 대형 항공사들이 그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매우 흥미롭지요. 이유는, 그게 아직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The idea is that if you smoke during the flight e-cigarette you publicly display your addiction and that is not a good pedagogical example for others and so on and so on. 금지하는 이유는 항공기를 타는 동안 전자담배로 흡연을 하게 되면, 당신은 공적으로 당신의 중독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남들 보기 좋지 않은(교육학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 mean I find this a clear example of how a certain ethics which is not just neutral ethics of health but basically I think it's ethics of don't fall into it, don't have a too passionate engagement. Remain at the proper distance, control yourself and so on. And now I will shock you to end. 저는 이것이 건강에 대한 중립적 윤리가 아닌 특정한 윤리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윤리는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고, 너무 열정적인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이고, 당신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놀라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I think even racism can be ambiguous here. You know once I made an interview where I was asked how do we find reactionary racism. 저는 인종차별 역시 이 지점에서 모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반응적인 인종차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You know what was my answer. With progressive racism. Then, ah, ah, what do you mean? Of course I didn’t mean racism. What I meant is the following things. Of course racist jokes and so on can be extremely oppressive, humiliating, and so on. 제 대답은, 좀 더 진보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것이었죠. 제가 의미하려 했던 바는 좀 뒤에 나오는데요. 물론 인종차별 농담같은 것은 엄청나게 억압적이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긴 하죠. But the solution I think is to create an atmosphere or to practice these jokes in such a way that they really function as that little bit of obscene contact which establishes true proximity between us.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농담들이 정말로 잘 작동할 수 있게 행하는 것이죠. 잘 작동한다는 것은, 약간의 저급한 접촉을 통해 상호간의 진정한 가까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And I’m talking from my own past political experience. Ex-Yugoslavia. I remember when I was young when I met from other — when I met with other people from ex-Yugoslavia republics — Serbs, Croat, Bosnians and so on. 이건 제 정치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사람들이요. We were all the time telling dirty jokes about each other. But not so much against the other. We were in a wonderful way competing who will be able to tell a nastier joke about ourselves. These were obscene racist jokes, but their effect was a wonderful sense of shared, obscene solidarity. 우리는 항상 서로에 대해 더러운 농담들을 해댔지만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더 저급한 농담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놀라운 관계였었죠. 저급한 인종차별 농담도 있었지만, 농담의 영향은 저급한 연대로서의 공유를 만들어냈습니다. And I have another proof here. Do you know that when civil war exploded in Yugoslavia, early '90s and already before in the '80s, ethnic tensions. The first victims were these jokes; they immediately disappeared. Because people felt well that, for example, let’s say I visit another country.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민족간에 긴장이 감돌았죠. 첫번째 희생자는 농담들이었습니다. 농담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번엔 다른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I hate this politically correct respect, oh, what is your food, what are your cultural forms. No, I tell them tell me a dirty joke about yourself and we will be friends and so on. It works. 저는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존중을 싫어해요. “당신의 나라 음식은 어떻습니까? 문화 형태는 어때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저급한 농담을 하나 던져준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So you see this ambiguity — that’s my problem with political correctness. No it’s just a form of self-discipline, which doesn’t really allow you to overcome racism. 이 애매함이, 제가 정치적 올바름이 문제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 훈육의 한 형태에 불과해요. 사실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죠. It’s just oppressed controlled racism. And the same goes here. I will tell you a wonderful story, a simple one. It happened to me a year ago around the corner here in the bookstore. 이건 억압되고 제어되는 인종차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간단한 거요. 1년 전 이 모퉁이 서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I was signing a book of mine. Two black guys came, African-Americans, I don’t like the term. My black friends also not, because for obvious reasons it can be even more racist. 저는 제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었죠. 두 명의 흑인이 왔어요. 아프리칸-아메리칸 말이죠. 저는 이 단어가 싫습니다. 제 흑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쪽이 명백히 더 인종차별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요. But the point is and they asked me to sign a book and seeing them there I couldn’t resist the worst racist remark. When I was returning the books to them I told them you know, I don’t know which one is for whom, you know, you blacks like yellow guys, you look all the same. 그 시점에서 그들은 제게 책에 사인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나 저급한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책을 돌려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죠. 사실 댁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가요. 흑인형씨들이나 황인형씨들이나. 비슷비슷해보인다니까.” They embraced me and they told me you can call me nigga. You know when they tell you this it means we are really close. They instantly got this. 그들은 저와 포옹했고, “괜찮으니, Nigga라고 부르쇼”라고 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들은 (이 농담의 효과에 대해서) 바로 알아챘어요. Another stupid problem I had. At some talk there was a mute and deaf guy and he asked if a translator can be there.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어느 대담장에 벙어리에 귀머거리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통역자를 대동해도 되는지 물어봤었습니다. And I couldn’t resist it. In the middle of the talk in front of 200-300 people, I said what are you doing there guys. My idea was that if you watch the gestures of the translator it looked to me as if some obscene messages or what. 또 저는 농담을 참을 수 없었죠. 200-300명 앞의 사람들 앞에서. (대담 중에) “댁들 뭐하시는거요?” 라고 통역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역하는 손모양이 굉장히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The guy laughed so much we became friends. And some old stupid lady reported me for making fun of crippled people. It was so didn’t she see that’s how I became friends with the guy. 그 양반은 엄청 웃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멍청한 아주머니가 장애인을 비웃는다고 저를 고발했죠. 그 아주머니는 그 사람하고 제가 친구가 된 부분은 보지 못 했던 겁니다. But I’m — wait a minute. Now I’m not an idiot. I’m well aware this doesn’t mean we should just walk around and humiliate each other. It’s a great art how to do it. I’m just saying that’s my hypothesis. Without such a tiny exchange of friendly obscenities you don’t have a real contact with another. 하지만 저는, 음.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놀림거리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제 가설이에요. 저열한 친근함을 약간이나마 교환하지 않는다면, 타인간 진정한 소통은 없는 것이라고. It remains this cold respect and so on, you know. We need this. We need this to establish a real contact. This is what is lacking for me in political correctness. And then you end up in madness like it’s not a joke. 그런 교환 없이는 차가운 존중상태만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 올바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미치는 상태로 끝나게 되고, 그거야말로 농담이 아니죠. I checked with my Australian friend. You know what happened in Perth, the west coast Australian city. It’s not a joke I repeated. The opera house there prohibited staging of Carmen. Opera Carmen, you know why? Because the first act takes place in front of a tobacco factory.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퍼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고, 호주의 서해안에 있는 도시이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오페라 하우스가 카르멘 상연을 금지했습니다. 오페라 카르멘이요. 왜인지 아세요? 1막이 담배 공장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농담 아닙니다. I’m just saying that there is something so fake about political correctness. It’s — I know it’s better than open racism, of course. But I wonder if it works because, you know, I never, for example, bought all these permanent replacement, you know. Niggers are Negros. Negros are black. Okay, black are African-Americans. Maybe — it’s up to them to decide. 저는 그냥 정치적 올바름에는 무엇인가가 너무 거짓된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공공연한 인종차별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전 절대로 다음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깜댕이들은 깜둥이고, 깜둥이들은 흑인이고, 그리고 흑인들은 아프리칸-아메리칸이라는 것. 아마 본인들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The only thing I know is that when I was in Missoula, Montana, I got engaged in a very friendly conversation with some Native Americans. They hate the term and they gave me a wonderful reason. They told me Native American and you are a cultural American so what, we are part of nature. They told me we much preferred to be called Indians. 제가 Missoula, 몬태나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거 한가지는 알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가까운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용어를 싫어하더군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내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면, 너는 교양 아메리칸인거냐 뭐냐,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다.” 그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At least our name is a monument to white men’s stupidity who thought they are in India when they come here. And they had such a wonderful insight into how all this New Age bullshit, you know, we white people technologically exploit nature while natives relate to nature in a dialogic way like before they dig into earth, they ask the mountain for permission if they are mining blah, blah. 최소한 인디안이라고 불리게 되면 그건 백인들의 멍청함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지 않는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왔을 때 인도인 줄 알았던) 그리고 그들은 이 뉴에이지 개소리같은 것에 대해서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인들은 원주민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땅을 파기 전 산에게 허락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They don’t mean that — research shows that Native Americans, Indians, killed much more buffalos and burned much more forests than white people. You know why this was the correct point. Like the message was the most racist thing is to patronizingly elevate us in that, you know, primitive, organic, living together with Mother Nature. 연구 결과는 인디안들이 백인들보다 더 많은 버팔로를 죽이고 더 많은 숲을 태웠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지점이에요. 가장 인종차별적인 것은, 원시의, 유기농의, Mother Nature같은 단어들을 써서 우리를 건방지게 높히는 그런 메시지들인거죠. No, their fundamental right is to be evil also. If we can be evil, why shouldn’t they be evil and so on. So again even with racism, one has to be very precise not to fight racism in a way which ultimately reproduces, if not directly racism itself, at least the conditions for racism. 아뇨, 악해질 수 있는 것 또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악할 수 있다면, 그들이라고 안될 게 뭐란 말입니까. 인종차별 얘기로 돌아오자면, 인종차별에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종차별 대신에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투쟁하지는 않도록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 유투브 베스트 댓글 Slavoj Zizek is right on the money. Give that man some crack cocaine! 지젝이 돈값을 하는구만. 이제 저 양반 코카인좀 가져다 줘야겠음. ㅇㅇ ------------------------------------------ 2015년 영상이니 꽤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아직까지도 의미가 있는 영상인듯 하여 굳이 공유해봅니다.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4-23 08:01)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7
이 게시판에 등록된 Eneloop님의 최근 게시물 |
|
전체주의 운운은 미시적 파시즘으로 비약하기 위한 지젝의 오바라 보는데,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도출한 [it's ethics of don't fall into it, don't have a too passionate engagement. Remain at the proper distance, control yourself and so on.]라는 결론에는 완벽히 동의합니다. 이건 현대 자유주의 교의죠. 이를 규범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지의 장막으로 대변되는 롤스식의 인간형일 테고요. 어떤 가치체... 더 보기
전체주의 운운은 미시적 파시즘으로 비약하기 위한 지젝의 오바라 보는데,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도출한 [it's ethics of don't fall into it, don't have a too passionate engagement. Remain at the proper distance, control yourself and so on.]라는 결론에는 완벽히 동의합니다. 이건 현대 자유주의 교의죠. 이를 규범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지의 장막으로 대변되는 롤스식의 인간형일 테고요. 어떤 가치체계와 선입견과 세계관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인간상 말이죠. '초인간적이다' '인간이 세상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것처럼 가정한다'고 비판 받았던. 근데 사실 그런 불편부당하고 초연한, '거리두기'를 우선하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유주의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cold respect'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흔히 서로 쥐고 패는 야만적인 관계가 상호 존중이란 명분하에 평화공존 이상의 유대를 가지지 못하는 예절바른 관계보다 훨씬 건전하고 끈끈할 때가 많은 것도 같은 이치죠. 무지한 촌로나 시정잡배들이 한껏 윤리적 교양을 뽐내는 지식인들보다 마이너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엽적인 게 아닌, 본질적이고 중한 문제에 있어 상대와 내적인 가치를 공유하려 할 때에 상호 존중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종교를 근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부부가 서로 신앙의 대상이 다를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화든 싸움이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며 상호의 의견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이에 실패하여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의 해결책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의견이 다르지만 소울 메이트요 위 아 더 월드임^^'과 같은 허영적인 리버럴 판타지는 존재할 수 없죠. 그건 양자가 종교를 근본가치로 생각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같은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찰과 분쟁과 폭력과 타협 같은 것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죠. 커플처럼 소규모든 정당처럼 대규모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거고요.
즉 '초연한 리버럴 중산층'이 도달할 수 없는 미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취존 만능주의'가 문제를 빚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에는 울타리를 치고 남들의 접근을 불허하며 자신만의 영지에서 자신만의 도그마를 고수하는 독단주의자들의 불모지가 잇따를 뿐이라, 이전투구와 합종연횡 같은 온갖 치열하고 극단적인 싸움 끝에만 도달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않아요'의 관계, 무언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한 동지적 유대감 같은 것이 자랄 가능성이 없지요. 곧 상호 존중은 상호 배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남의 경계는 뚜렷해지는 거죠. 누구도 조금의 희생조차 감수하지 않는 각자도생 메타가 그렇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cold respect'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흔히 서로 쥐고 패는 야만적인 관계가 상호 존중이란 명분하에 평화공존 이상의 유대를 가지지 못하는 예절바른 관계보다 훨씬 건전하고 끈끈할 때가 많은 것도 같은 이치죠. 무지한 촌로나 시정잡배들이 한껏 윤리적 교양을 뽐내는 지식인들보다 마이너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엽적인 게 아닌, 본질적이고 중한 문제에 있어 상대와 내적인 가치를 공유하려 할 때에 상호 존중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종교를 근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부부가 서로 신앙의 대상이 다를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화든 싸움이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며 상호의 의견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이에 실패하여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의 해결책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의견이 다르지만 소울 메이트요 위 아 더 월드임^^'과 같은 허영적인 리버럴 판타지는 존재할 수 없죠. 그건 양자가 종교를 근본가치로 생각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같은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찰과 분쟁과 폭력과 타협 같은 것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죠. 커플처럼 소규모든 정당처럼 대규모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거고요.
즉 '초연한 리버럴 중산층'이 도달할 수 없는 미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취존 만능주의'가 문제를 빚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에는 울타리를 치고 남들의 접근을 불허하며 자신만의 영지에서 자신만의 도그마를 고수하는 독단주의자들의 불모지가 잇따를 뿐이라, 이전투구와 합종연횡 같은 온갖 치열하고 극단적인 싸움 끝에만 도달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않아요'의 관계, 무언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한 동지적 유대감 같은 것이 자랄 가능성이 없지요. 곧 상호 존중은 상호 배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남의 경계는 뚜렷해지는 거죠. 누구도 조금의 희생조차 감수하지 않는 각자도생 메타가 그렇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긴 한데, 말을 과하게 중시한다 싶어요. 논증으로 모든 게 입증되고 판명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당장 결론 내고 정답 낼 수 있다고 여겨서 조급하고..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고요. 경중이나 중용이나 가감이나 느슨한 종합, 확률적 인식, 침묵과 무언 속에 이루어지는 적당한 타협이나 공존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래디컬하게 본질주의적으로 사안에 접근하죠. 그나마 그걸 정교하게 하면 학술이라도 되는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소재에서 어거지로... 더 보기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긴 한데, 말을 과하게 중시한다 싶어요. 논증으로 모든 게 입증되고 판명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당장 결론 내고 정답 낼 수 있다고 여겨서 조급하고..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고요. 경중이나 중용이나 가감이나 느슨한 종합, 확률적 인식, 침묵과 무언 속에 이루어지는 적당한 타협이나 공존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래디컬하게 본질주의적으로 사안에 접근하죠. 그나마 그걸 정교하게 하면 학술이라도 되는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소재에서 어거지로 특정 측면만 부각시켜서 자의적으로 엑기스 뽑아낸 다음 오만 레토릭 덕지덕지 붙여서 대의명분으로 포장해서 도그마를 만드는 식이죠. 그렇게 키메라 도그마 한 번 정립되면 MMORPG에서 풀템 맞춘 것마냥 근자감에 쩔어서 적대자들 그림자만 보여도 마패나 부적 내세우듯 우려먹고. 그러다가 유통기한 다해서 진영전에서 쓸모 없어진다 싶으면 어제의 마패를 오늘의 사짜로 치부하며 가차없이 버리고..
저도 영어가 많이 짧지만, 맨 마지막 문단에서 directly racism이나 the conditions for racism이 reproduce의 목적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ㅎㅎ
"아뇨, 악해질 수 있는 것 또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악할 수 있다면, 그들이라고 안될 게 뭐란 말입니까. 인종차별 얘기로 돌아오자면, 인종차별에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종차별 대신에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투쟁하지는 않도록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뇨, 악해질 수 있는 것 또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악할 수 있다면, 그들이라고 안될 게 뭐란 말입니까. 인종차별 얘기로 돌아오자면, 인종차별에 투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종차별 대신에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투쟁하지는 않도록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글리딜리셔스에서 본 일화가 떠오르네요. 흑인 코미디언이 치킨과 흑인의 연상 관계를 이용한 코미디를 하는데, 이게 역시 참 웃겼는데, 어느 백인 관객이 너무 크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은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고 쇼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제가 잘 안통하는 사회가 있지요. 지젝이 어떤 의미로 이런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파편화된 개인끼리 '어떠한 불편함'도 원치 않는 것이 빠르고 깊게 퍼진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인들 까는 불확실한 루머중 하나가 혼네(진심)과 다테마에(가식)이 달라서 깊은 관계를 못가진다 통수친다 이런게 있었는데, 이게 폐를 끼치지않아야 한다는 강박과 합쳐져서 개인중심문화가 생겼고 그걸 까면서 우리는 정이 깊다 뭐 이런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시민들 역시 서로에게 강박에 가까운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의... 더 보기
그런데 이 전제가 잘 안통하는 사회가 있지요. 지젝이 어떤 의미로 이런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파편화된 개인끼리 '어떠한 불편함'도 원치 않는 것이 빠르고 깊게 퍼진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인들 까는 불확실한 루머중 하나가 혼네(진심)과 다테마에(가식)이 달라서 깊은 관계를 못가진다 통수친다 이런게 있었는데, 이게 폐를 끼치지않아야 한다는 강박과 합쳐져서 개인중심문화가 생겼고 그걸 까면서 우리는 정이 깊다 뭐 이런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시민들 역시 서로에게 강박에 가까운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의 친밀감과 불편의 공존을 못견뎌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열한 농담을 주고받는다는건 일종의 경계의식을 허무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허물고 싶지 '않아'한다는게 무서운거고, 이건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닌 '연대의식'마저 일종의 이해관계로 환원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못 갖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꼭 연대의식이 작동할 수 없냐면 그건 아닌데, 선을 지키는 존중안에서의 연대의식을 보면 대체로 약하죠. 연민과 동정이 아닌 연대의식에는 자기의 경계선이 그대로 존재하니까 내밀한 의미에서의 연대성을 갖기가 어려운. 그래서 잘 무너지고..
이걸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것도 타당하지만, 저는 역시 이런건 불편의 총량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하고. 교육의 영향같기도하고, 경제적 문제같기도하고. 좀 더 복잡한거같아요. 더 어렵게 살때도 더 강한 연대의식을 가졌다면 왜 지금은?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연대의식보다 이해관계에 의한 합리적 공동체가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일반적으로 좋게 여겨지고) 역전이 가능한가 싶기도하고.. 문제는 그런 합리적 공동체가 지젝이 말한 새로운 권위주의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문제인셈..
이걸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것도 타당하지만, 저는 역시 이런건 불편의 총량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하고. 교육의 영향같기도하고, 경제적 문제같기도하고. 좀 더 복잡한거같아요. 더 어렵게 살때도 더 강한 연대의식을 가졌다면 왜 지금은?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연대의식보다 이해관계에 의한 합리적 공동체가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일반적으로 좋게 여겨지고) 역전이 가능한가 싶기도하고.. 문제는 그런 합리적 공동체가 지젝이 말한 새로운 권위주의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문제인셈..
| 목록 |
|